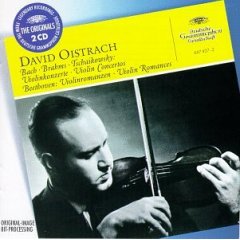Schumann: Piano quintet op.44 & String quartet op.41
몇 년 만에 듣는 슈만 피아노5중주 & 현사인가!!!
딱 짧게, 얼마만의 뭐뭐인가! 로 끝나야 되는 문장인데 뭐뭐에 들어간 게 기니까 글맛이 떨어진다 -_-
그리고, 몇 년 만이 아닌 게 대체 뭐냐. -_- 몽땅 다 몇 년만에 듣는단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누굴 빌려줬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경우다. 내 손을 떠난 씨디지만, 나름 좋아하는 곡이고 그보다는 좋아하는 연주라, 생각나서 찾을 때마다 으윽거리다 얼마전에 풍월당에 갔을 때 폐반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늑장부리다간 영영 빠이빠이겠구나 싶어 인터넷을 뒤져 딱 한 장 남아있던 걸 건졌다. \(´ ∇`)ノ
지난 달 티비 켤 때마다 7인의 음악인들-이라고 해서 김선욱,양성원,송영훈,정명훈,최은식,김수연,이유라의 공연광고가 계속 나왔는데, 그 배경음악이 이 슈만 피아노 5중주라 더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슈만이 가장 행복했을 거라 말들 하는 시절, 클라라와 결혼하고 나서 작곡한 음악. 시원하게 총주로 시작해 첼로와 바이올린이 주제를 연주하며 주거니 받거니 어우러지는 5중주부터 풍부하고 아름답지만 중간중간 긁어내리며 불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현사까지 다 들으면 왜 고전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 실내악으로 귀결되는지를 알 것 같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도 어찌나 실내악 예찬이 줄줄이 이어지는지. 내 경우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씨디자켓 그림은 Caspar David Friedrich의 그림이다. 이 사람 그림 중에는 베토벤 후기 피아노소나타 길렐스 반의 표지로 유명한 「북극해」가 있다. 프리드리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연주에서 피아노를 친 폴 굴다는 프리드리히 굴다의 아들이다. 굴다는 천재라고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한 굴드가 쫌 더 유명하기 때문인지 굴드 짝퉁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부석사 갈 때 WTC를 프리드리히 굴다 버전으로 들었는데 터치에서 재즈 냄새가 나더라. 클래식은 피아노를 칠 때 거의 손가락 끝으로 친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서도 늘 달걀을 하나 쥔 듯한 모양을 해라 손톱을 심하게 짧게 깎아라- 가르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손톱모양도 그렇고 첫번째 관절이 힘이 없어서 칠 때마다 관절이 미세하게 한번씩 꺾였다 펴지기 때문에 맑고 단단한 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반면, 재즈는 주로 손가락의 지문부분으로 치게 된다. 마치 건반을 훑어내리듯이. 그러다 보면 나게 되는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에는 내 언어가 너무 짧고. 굳이 표현하자면 싱코페이션에 가깝긴 하겠다.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클래식 연주자가 완전히 재즈 느낌을 내기도 쉽지 않고, 재즈 치던 사람이 완벽한 클래식을 하기도 어렵다. 하여간 굴다의 WTC에선 그 느낌이 났다.
그 연주는 mp3 파일로 예전에 받은 건데 년도를 확인해보니 72년 녹음이다. 생각난 김에 검색, 과연 굴다는 30대 후반부터 재즈에 심취했다고 한다. (굴다는 30년생) 72년이면 완전히 재즈로 돌아섰을 때다. 내가 그냥 들어도 알아들을 정도니 굴다라고 하면 애증을 드러내는 클래식팬들이 이해가 간다. (말이 애증이지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_-) 그나마 바흐곡이었으니 괜찮았지만 만약 다른 작곡가의 곡에서도 그런 터치가 느껴지는거라면...? 음...
그건 그렇고. 이 곡에 관해서는 두개의 연주를 가지고 있다. 발매되던 해에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찬사를 받았던 제헤트마이어 쿼텟 음반과 이 하겐 쿼텟인데 둘 다 좋다.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말하면 좋은 연주라고 생각하는 건 하겐인데, 좋아하는 건 제헤트마이어쪽이 조금 더. 하겐이 정석적이고 정확한 연주를 들려준다면 제헤트마이어는 어디서 툭 튀어나온 다크호스; 같은 연주를 들려줘...그러니까 만화책 유리가면에서의 두 홍천녀랄까; 한쪽만 꼽기 아쉽게 좋아 하겐을 듣고 나면 꼭 제헤트마이어까지 들어야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걸 들을때마다 아... 이젠 슈만을 좀 알아가 볼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놈의 천성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얕고 얇은 호기심 때문에 딴 거 듣다보면 계속 미루게 된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이번 여름엔 쇼팽을 좀 들어볼까? 라는 호기심에 쌓아 놓은 쇼팽씨디가 둘 넷 여섯...16장이구나. -_- 같은 높이로 책도 쌓여있다는 것이 이 비극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아흐-
여름 밤은 정말 음악을 듣기에 좋은 계절이다. 아쉽구나. 진작 진작 열심히 들을 걸. 후회의 콧물이 인중을 가린다. ㅠ_ㅠ